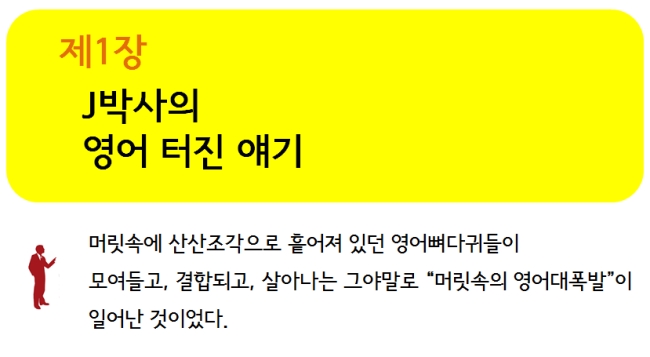내가 종로 2가 연구실에서 영어교수법 개발에 몰두하고 있던 시절 얘기다. 한 심리학 박사와 우연히 알게 되어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 분은 내 연구실과 같은 건물에서 심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생소원이 바로 영어 잘하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공부라면 종류 불문하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었지만, 유독 영어회화 만큼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학계에서도 입지를 굳히고, 클리닉 운영도 그런대로 안정되고 해서, 해외 학회에도 진출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 동안 몇 차례 다녀온 국제학술 모임은 다시 생각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가끔씩 나오는 전문용어 외에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 미리 배포된 유인물만 뒤적이다 끝나기 일쑤고, 자신이 맡은 발표도 미리 번역해 간 원고만 냅다 읽고는, 혹시 질문이라도 나올까 무서워 도망치듯 단상을 내려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리셉션 파티를 비롯한 소규모 모임이었다. 기껏해야 주변의 몇 사람과 어디 출신이냐, 언제 왔냐… 등의 의례적인 얘기만 몇 마디 주고받은 후엔, 도대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웃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심각한 것 같으면 따라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남들이 웃으면 바보 같이 그냥 따라 웃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야말로 고역중의 고역이었다.
그래서 좋다는 학원은 다 다니며, 회화도 배워보고, 문법도 배워보고 하다가, 요즘은 아침마다 원어민 선생을 사무실로 불러서 개인교습을 받고 있는데, 그저 간단한 대화 정도는 외워뒀던 표현으로 그럭저럭 되지만, 정작 좀 내용 있는 말을 하려면 도대체가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화중에 내가 새로운 영어교수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기 영어만 되게 해주면 평생은인으로 알겠다며, 자기를 실험대상으로 써 달라고, 틈만 나면 내 연구실에 찾아와 내 귀중한 시간을 축내곤 했다.
하루는 이런 저런 잡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가 치료해 오던 우울증 환자가 하나 있는데, 지난 몇 개월간 치료가 잘 돼서 조만간에 졸업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어젯밤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비 맞으며 울고 있는 것을 봐서 몹시 속상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을 영어로 한번 해 보시죠.”하고 말했더니,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한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단어도 몰라요? 한 번 해 볼까요? 어젯밤은 영어로 뭐라 하지요?”
“음, 어제가 yesterday니까 yesterday night 하면 되나요.”
(미국식은 보통 last night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뜻은 통한다.)
“그럼요, 잘하시네요. 그럼 ‘길거리에서’는?”
“길거리는 street인데 ‘에서’는 뭐라고 하나?”
“on the street”
“맞아, 전치사를 넣어야지. on the street.”
“그 사람은?”
“에이 그거야 ‘he’이지요.”
“그럼 비를 맞으며는?”
“비는 rain인데 맞으며는 뭐라고 하지…?”
“그럴 때는 그냥 빗속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빗속에서’는? ”
“in the rain?”
“좋아요. 잘하시네요. 그럼 ‘울고 있는’은?”
“cry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자 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의 ‘봤다’는 뭐라고 하나요?”
“see”
“좋아요. 그걸 보고 몹시 속상했어요. ‘속상했다’는 영어로?”
“글쎄요. 뭐라고 하지? 모르겠는데요.”
“I’m sorry. 하면 되지요.”
“아, 그래도 되나요? 쉽네. I’m sorry.”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단어네요.”
“정말 그러네요. 다 아는 말들이네. 근데 왜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래요, 박사님은 지금 다 아는 단어인데도 말을 못 만드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말을 해 볼까요? 영어는 무슨 말이든지 ‘누가 무엇을 했다’로 시작합니다. 자 ‘나는 어젯밤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누가 뭘 했다는 말이지요?”
“음,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보았다’는 말이죠. 그걸 영어로 하면?”
“음, I uh see–d.”
“그렇죠. I saw.”
“아, 그렇지. see는 불규칙이지. 맞아요. I saw.”
“그래요. I saw. 내가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죠?”
“내가 … 그 사람을 보았죠.”
“그걸 영어로 하면?”
“I saw him. 맞나요?”
“그럼요. 그 사람이 뭘 하는 것을 봤나요?”
“우는 것을 봤지요.”
“영어로 하면?”
“글쎄요 우는 건 cry인데…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냥 뒤에다 붙이면 되지요. I saw him cry.”
“맞아, saw가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을 쓰는 거지…. I saw him cry.”
“그래요, 잘 아시네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만 따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뒤에 붙여 나가면 됩니다. 이 문형을 연습 좀 해 볼까요? ‘나는 그 사람이 뛰는 걸 보았다’하면?”
“I saw him … run.”
“그렇죠. 자, saw와 run에 강세를 넣어서 I saw him run.”
“I saw him run. 강세를 넣으니까 훨씬 나은데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춤추는 걸 보았다.”
“I saw him dance.”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보았다.”
“I saw him sing.”
“잘 하시네요. 나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보았다.”
“I saw him study.”
” 뭘 공부하는가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걸 보았다.”
“I saw him study English. 하면 되나요?”
“그럼요. 아주 잘하시네요. 쉽지요? 자, 그러면,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나는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면…”
“I saw him cry.”
“좋아요. 그런데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을 강조하려면 cry 뒤에 ~ing만 붙여서 crying 하면 됩니다. I saw him crying. 이렇게.”
“I saw him crying.”
“그렇죠.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빗속에서 울고 있었죠? 빗속에서는?”
“in the rain.”
“그렇죠. 붙여서 말하면?”
“I saw him crying in the rain.”
“그렇죠. 길거리에서 울었죠. 길거리에서는?”
“on the street.”
“그게 어젯밤이었죠?”
“yesterday night.”
“그렇죠. 그냥 last night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동시통역해 보세요.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I saw him”
“울고 있는 것을?”
“crying”
“빗 속에서?”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어젯밤…”
“last night”
“자, 처음부터 죽 이어서 말해보세요.”
“I saw him crying in the rain on the street last night.”
“잘하시네요.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걸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이어 나가니까 되네요. 일부러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되네, 야! 참 신기하다. 내 평생 이렇게 영어문장을 외우지 않고 편안히 말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거 참 신나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J박사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선생님, 다른 말들도 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조금만 더 해보지요.”
J박사는 마치 지옥에서 가브리엘 천사라도 만난 것처럼 나에게 매달렸다.
“나는 어젯밤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걸 보았다.”
“I saw him / standing / in the rain / on the street / last night.”
“나는 어젯밤 그 사람이 정원에서 달밤에 춤추는 걸 보았다.”
“I saw him / dancing / in the moonlight / in the garden / last night.”
******
이런 식으로, 그날 나는 꼬박 3시간 이상을 J박사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이후로 J박사는 폭발적으로 영어가 늘기 시작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영어문장의 원리를 깨닫고, 청크 단위로 결합하는 영어의 원리를 순서대로 연습하면서, 그때까지 머릿속에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영어뼈다귀들이 모여들고, 결합되고, 살아나는 그야말로 ‘머릿속의 영어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었다.
워낙에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고, 영어의 기본 밑천인 어휘력을 두둑이 갖추고 있던 분이라서 발전이 더욱 빨랐다.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J박사의 영어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나하고 연습할 때는 그런대로 잘 나오던 영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 사람들하고 하거나, 주변에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서 여전히 버벅거린다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영어공포증이었다. 심리학 박사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영어공포증에는 장사가 없었다.
매일같이 붙들려서 시간을 뺏기는 것도 힘들어서, 웬만하면 이쯤에서 졸업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J박사와 다시 씨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자, J박사 영어 터지던 얘기는 제5장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머릿속에 널려있는 영어뼈다귀 얘기를 해보기로 하자.